스포츠
[장원재의 논어와 스포츠] 2013 한국시리즈와 1982 한국 시리즈의 추억
기사입력 2013.11.03 15:46 / 기사수정 2013.11.03 17:00
김덕중 기자

[엑스포츠뉴스=장원재 칼럼니스트] 2013년 한국 시리즈가 끝났다. 원년부터 두산 팬이었던 소생에게는 아쉽고도 서러운 결말이다. 3승1패로 앞서다 3연패하며 분패. 페넌트레이스를 4위로 마치고 정규시즌 이후에도 16게임을 더 했으니 체력의 무리가 오죽 심했으랴.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길 것이라 생각했으니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나보다.
시리즈 시작 전, 삼성 대 두산의 대진표를 보며 82년 원년의 추억에 잠겼다. 1982년 9월 29일 대구구장. OB 대 삼성의 후기리그 마지막 대결. 당시 총 경기 수는 팀 당 80경기. 총 6팀이 전후기 리그 40경기씩을 치르고, 각 리그 우승팀이 한국시리즈를 치른다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다.
이론 상 전기리그 우승팀이 후기리그에서 꼴찌를 해도 한국시리즈에 나설 수 있었다.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에서도 전기우승팀이 ‘외인구단’과 한국시리즈에서 맞서기 위해 후기리그를 포기하고 외인구단이 했던 지옥훈련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설정이 있다.) 전기리그의 우승자는 OB 베어스. 양 팀 공히 후기리그 39번째였던 이 경기 전까지 OB는 2위 삼성에 후기리그 성적 반게임을 앞서가고 있었다.
OB는 24승 투수 박철순에 상당부분 의지하는 팀이었고, 삼성은 이선희 황규봉 권영호 등 15승 투수 3명을 자랑했다. 단기전으로 가면 불리한 건 OB였다. 전기리그 우승 후 ‘후기리그는 쉬엄쉬엄 체력을 비축하며 한국시리즈에 대비하겠다’던 김영덕 감독은 후기리그 중반 전략을 수정했다. 전기리그에서만 18승 2패 3세이브를 올린 박철순을 아끼고도 백업들의 선전으로 선두를 내달리자 마음이 바뀌었다. 보다 확실한 길로 가겠다. 아예 후기리그도 석권하고 통합우승을 해버리겠다는 대권도전 선언. (실제로 삼성이 85년 시즌 전후기 리그를 모두 석권하며 한국시리즈 없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 시리즈가 열리지 못한 건 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당시 삼성 감독이 김영덕이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역시 딱 한 번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못했다. 1994년 시즌이다. 이유는 시즌 중반인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된 선수들의 파업.) OB가 이기면 그대로 통합우승. 우승하면 좋겠지만, 한국시리즈가 없다면 하이라이트 없이 시즌이 끝나는 것 아냐? 베어스 팬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며 TV로 경기를 지켜보던 소생의 눈에 심판의 미묘한 판정이 거듭된 듯 보인 건 오해였을까 착각이었을까.
22시 30분까지의 결과는 무승부. 규정대로라면 그 시각 이후에는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 현장에 나와있던 KBO관계자들이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렸다. ‘야구선진국 메이저리그 룰에 따라 승부가 날 때 까지 무제한 연장전을 한다.’ 비겨도, OB가 시즌 마지막 경기 MBC 청룡 전을 이기면 역시 전후기 통합 우승인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공교롭게도, 82년엔 무승부 경기가 단 한 경기도 나오지 않았다. 해태 대 MBC의 경기가 동대문운동장 조명탑이 나가는 바람에 4회까지 이어지다 노게임이 선언된 적은 있었지만. (변압기 고장으로 조명이 꺼졌고, 인근 장충체육관 변압기를 빌려다 경기를 속행했는데 다시 전기가 나갔다. 김봉연 선수가 팬서비스를 한다고, 에나멜을 바른 반짝거리는 헬멧을 쓰고 나왔던 추억 한 자락.) 이것이 KBO가 억지인 줄 알면서도 무제한 승부를 봐야한다고 끝까지 우길 수 있었던 배경이다. 전례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규칙이라며 밀어붙이는 데는 장사가 없었다. 하기야 야구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비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OB는 12회 연장 승부 끝에 이 경기를 내줬다. 후기리그 6승2패 4세이브를 거둔 박철순이 손상대의 기습번트를 수비하다 허리를 삐끗한 것도 엄청난 손실이었다.
전기리그 우승팀 OB 베어스의 홈구장 대전에서 열린 역대 한국시리즈 제1호 경기. 외야에는 관중석 대신 포플러나무가 심어진 둔덕이 있던 시절이다. 양 팀의 선발투수는 강철원과 권영호. 한국시리즈 등판 1호 투수 강철원은 그 해 시즌 성적이 5승 무패였는데 모두 전설의 팀 삼미 수퍼스타즈를 상대로 거둔 전과(戰果)였다.
원년 OB의 대 삼미 전적은 16전 전승. (83년 시즌 양 팀의 첫 경기에서 9회까지 4-4로 이어지다 연장전에서 삼미가 연속득점에 성공하며 감격의 첫 승을 올렸다. 승리투수는 장명부, 패전투수는 장호연이다.) 깜짝선발 강철원은 정말 잘 던졌다. 함학수에게 허용한 2점 홈런과 9회초 배대웅에게 맞은 동점 2루타 등 9회까지 단 2안타로 호투. OB는 10회부터 서울고 출신 선우대영이 마운드로 올라왔고 삼성은 이선희로 맞대응했다. 안타 수는 OB가 12-3으로 우세했지만 경기는 15회 연장 끝에 3-3 무승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무승부 경기다.
5이닝을 던진 이선희는 2차전에서도 선발 등판, 5.1이닝을 또 던진다. 양 팀 홈에서 한 경기씩을 치르고, 나머지 경기는 서울에서 개최하던 시절이다. 그래서 이선희는 한 해의 한국시리즈에서 세 개 도시의 마운드에 올랐던 첫 번째 투수로도 이름을 남겼다.
강철원의 투구폼은 요즈음 정대현과 비슷했다. 빨라 보이지 않는데, 지저분한 구질로 타이밍을 빼앗는 스타일. 삼성의 진동한이 본격적인 언더스로였고, OB의 박상열과 삼성의 양일환은 사이드 암이었다. MBC에는 역사적인 프로야구 개막전 선발 이길환이 언더였고 요즈음 해설자로 인기를 모으는 이광권은 팔의 각도가 훨씬 더 아래에서 올라오는, 일본 롯데의 와다나베 슌스케같은 타입의 잠수함 투수였다.
해태의 83년 우승주역 재일동포 주동식도 사이드 암에 가까운 언더스로였다. 81년 전국대회 우승의 주역 광주상고의 언더스로 윤여국(당시의 유격수가 이순철)은 성균관대 진학 이후 왜 성적을 내지 못한 걸까? 김병현과 비슷한 투구폼으로 강속구를 뿌리던, 손목 힘이 남달리 강했던 경북고의 언더스로 에이스 문병권도 역시 ‘사라진 투수’다. 경북고와 결승전을 앞둔 광주 진흥고 선수들은 경기 전 날 동향의 선배 경희대의 언더스로 박노삼에게 ‘적응훈련’을 부탁했는데, 진흥고 선수들이 경기 전 타격연습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눈여겨 본 경북고가 유격수 홍순호를 선발투수로 변칙기용하는 바람에 진흥고가 당황해서 서두르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전했다는 일화도 있다.
78년 대학야구 춘계연맹전에서 당대 최고 한양대와 맞서 완투했지만 9회말 장효조에게 솔로홈런을 얻어맞고 0-1로 진 인천체전의 김상선과 역시 78년 대통령배 신일고의 막강타선에 일기당천(一騎當千)으로 맞섰으나 최홍석의 좌중간 홈런 한 방에 역시 0-1로 완투패한 뒤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뿌렸던 대광고의 박건도 각각 언더스로와 사이드암이었다.
논어에 나온다.
冉求曰 非不說子之道언마는 力不足也로이다
염구왈 비불열자지도(언마는)역부족야(입니다)
子曰 力不足者는 中道而廢하는데 今女는 畫이로구나
자왈 역부족자(는)중도이폐(하는데)금여(는)획(이로구나) 6/12
해석)
제자 염구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힘이 부족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서 포기하는데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OB가 삼성을 4승1무1패로 따돌리며 원년 챔피언의 왕관을 쓴다. 어쨌거나, 1982년 원년에 한국시리즈가 열렸던 것이 오늘날 한국 플로야구 중흥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2013년 시리즈가 끝나고 류중일 감독은 “김진욱 감독 어디 게시냐?”고 적장을 배려했고, 김진욱 감독은 “우리 팀에 패자는 없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핑계를 대지 않고, 남 탓 제도 탓 선수 탓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의연하게 상대를 배려한 양 팀의 수장이 소생은 자랑스럽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야구문화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 아닐까. ‘스스로 한계를 긋는’ 사람이 없고 다들 ‘내년에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겠다’는 건강한 다짐만 있을 뿐이니. 그러고 보니 베어스의 초대감독이자 원년 우승 사령탑 김영덕 감독도 사이드암 투수였다. 일본 프로야구 난카이 호크스에서 6승6패를 기록하고 허리부상으로 퇴단한 뒤 한국에 건너와 실업야구 선수로 몇 년 간 활약. 그가 기록한 한 시즌 방어율 0.32는 실업야구 시절 불멸의 금자탑이었다. 잊을 뻔 했다. 두산 베어스의 현 사령탑 김진욱 감독도 사이드 암 투수 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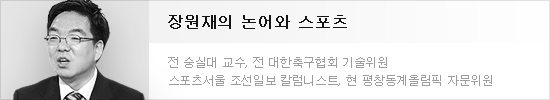
장원재 칼럼니스트 sports@xportsnews.com
[사진=2013 한국시리즈 ⓒ 엑스포츠뉴스DB]
김덕중 기자 djkim@xportsnews.com
- ▶ 치어리더 김나연, 맨몸인 줄 알았네…파격 비키니샷 대방출
- ▶ '모찌 치어' 이연진, 허리 다 드러낸 파격룩…꽉 찬 라인에 팬들 환호
- ▶ 티아라 효민, 무슨 일…나체 사진 공개? 누드 착시 '깜짝'
- ▶ '맥심 인증 베이글녀', 한뼘 의상으로 섹시 MVP 등극…아찔 영상 공개
- ▶ 맹승지, 파격 란제리 화보…노출 수위 끝판왕 등극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위기의 '나혼산', 정면돌파 택했다…NEW 멤버 쫙 세우고 "새롭게 해봐♥" 새해 각오+단체컷 [엑's 이슈]
- 2 '키스' 숙행 불륜 논란 계속…입 연 유부남 "내 여자문제 처음 아닌데, 이혼 전제였다" [엑's 이슈]
- 3 22기 상철, 소송 이혼 사유 충격 "TV 나올 법 해, 전처 떵떵 거리며 살 것 같아서" (나솔사계)[종합]
- 4 44세에 둘째 출산…이시영 "하반신 마취, 자궁 적출 위기"
- 5 故 송도순 별세…"열흘 전부터 혼수상태, 결국 떠났다" 마지막 사진 공개 [종합]
- 6 [전문] 2026년 이효리 떴다 "나이 많아 안돼 포기했던 것 다시 노력, 열정+도전과 친해지고파"
- 7 누구세요? 블핑 제니 못 알아볼 뻔…'파격 숏컷' 확 달라져→새 솔로 음악 예고 [엑's 이슈]
- 8 '박나래 정신 차려라' 경고한 역술가, '50대 미혼' 반전에 깜짝 (최화정이에요)
- 9 [전문] 조윤우, 돌연 '은퇴+결혼' 동시발표 "15년 배우 생활 접는다" 사진 공개…팬들 응원+섭섭
- 10 박나래는 술잔을 어디에 던졌나…의견 엇갈린 상황 속 "4바늘 꿰매" 상해진단서 제출 [엑's 이슈]
- 1 "조두순 61만, 김보름 60만?…김보름이 흉악범도 아니고 심하네"→광기에 난도질 당한 스케이터의 은퇴, 세상 원망하지 않았다
- 2 충격 또 충격! 中 2억5000만명 인해전술로 안세영-서승재 독주 막는다!…"배드민턴 인구 역대급, 인재 키워 세계선수권+AG+올림픽 金 싹쓸이"
- 3 전재산 2조7000억 호날두 '584억' 초호화 저택 '상상초월!'…"순금 수도꼭지에 루이비통 벽화까지"
- 4 日 감독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숙였는데→180도 돌변+"다크호스로 우승" 파격 선언!…신년인사 '이길 승(勝)' 내걸었다
- 5 양민혁(19·레알 마드리드) 충격 이적 성사? 토트넘 "NO" 거절…"잠재력 인정" vs "다소 의외의 관심" 현지 반응 엇갈렸다
- 6 손흥민, 메시 '또또' 이겼다! 오피셜 공식발표 떴다!…MLS 선수들이 직접 선정 "같이 뛰어보고 싶다"
- 7 홍정호 폭탄 발언! "선수로서 존중받지 못했다"… 8년 동행 마침표 찍은 '전북 레전드', 수원행 앞두고 '충격 고백'
- 8 "94.8% 안세영, 경쟁자 깡그리 그늘에 몰아넣었다!" 엄청난 극찬…싱가포르 유력지 '2026년 스포츠계 주요 이정표' AN 지목!
- 9 '초대박!' UFC 최강 커플 탄생!…'불합리한 왼손' 페레이라, 신년 맞아 여성 플라이급 파이터 코르테즈와 열애 발표→키스 모습도 공개
- 10 김혜성 트레이드? 새빨간 거짓말이었네!…"KIM 2029년까지 핵심 멤버, 다저스 왕조 유지 가능" 美 평가
- 1 국제 대회 순간부터 ‘피넛’ 은퇴까지…LCK 사진전 ‘시퀀스’ 성황리 마무리
- 2 SOOP, 2026 시즌 앞두고 ‘DN SOOPers’ LoL팀 출정식 1월 3일 진행
- 3 스틸프론트, 네이버웹툰 IP 기반 게임 'Unfolded: Webtoon Stories' 정식 출시
- 4 '승리의 여신: 니케', 찜닭 브랜드 '두찜'과 2026년 1~2월 컬래버
- 5 5민랩 ‘스매시 레전드’, 네이버웹툰 ‘더블클릭’ 세계관과 만난다
- 6 '그랑블루 판타지', 2026년 3월 10일 스팀 버전 출시…16:9 비율 적용
- 7 카카오게임즈 ‘오딘: 발할라 라이징’, 신규 전직 클래스 포함 상반기 업데이트 미리 공개
- 8 펄어비스 ‘검은사막’, 인게임 기부 이벤트로 해외 재난 피해학교 복구 지원
- 9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울림성우학원, 개발자·성우 연계 위한 '게임 보이스 랩' 운영
- 10 넥써쓰, 실제 플레이 기반 온체인 경제 구축하는 ‘크로쓰 포지’ 선보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故이순재 유언 공개됐다…박근형 "마지막으로 본 건 1월, 연극계 맡아달라고" [엑's 이슈]
- 2 최여진, 결혼 6개월만 안타까운 비보…"실감 안 나, 가슴 후벼파는 아픔" [전문]
- 3 故김영대, 딸과 영화 본 후 돌연 사망…안현모 "진정한 패밀리맨" 추모
- 4 '출산' 황하나, 400만원 패딩 입고 구속→'전 남친' 박유천 근황 보니 '급노화' [엑's 이슈]
- 5 김영희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부친 빚투 논란 심경
- 6 '재벌 3세' 황하나, 하다하다 '구속 패션' 화제…"400만원 명품 롱패딩" 난리 [엑's 이슈]
- 7 '갑상선 투병' 지예은, 안타까운 근황…"수술까지 받았는데…"
- 8 '심정지 상태 이송' 안성기, 위급 고비 넘겼지만…아직 의식 못 찾았다
- 9 티아라 효민, 무슨 일…나체 사진 공개? 누드 착시 '깜짝'
- 10 맹승지, 파격 란제리 화보…노출 수위 끝판왕 등극
- 1 [오피셜] 손흥민, '1300억 러브콜' 중동서 또 초대박! '공식발표' 떴다!…"이게 바로 SON 마케팅 파워"→LAFC, 글로브 사커 어워즈 '베스트 클럽 브랜딩' 수상
- 2 치어리더 김나연, 맨몸인 줄 알았네…파격 비키니샷 대방출
- 3 '대만이 반한' 치어리더 이다혜, 몸매로 섹시 레전드 등극
- 4 충격, 또 충격! 정대세 "빚 46억 있다"…아내도 깜짝! "이혼 사안 아냐?" 日 방송도 경악→축구만 한 것 같았는데 어쩌다가
- 5 [오피셜] 안세영 한국 다시 떠난다, 파격행보 공식발표!…2026년 0시10분 출국, 새해 타종 비행기서 듣는다
- 6 "안세영, 왕즈이 상대로 기권했을 수도…그런데"→AN '부상 투혼+강철 멘털' 인도네시아 매체 극찬
- 7 "김상식 당장 잘라!" 0-4 충격패, 베트남 폭발했는데!…드디어 정의구현 '몰수승' 보인다→"AFC, '불법 귀화' 말레이시아 6년 금지 중징계 줄 수도"
- 8 안세영 덕에 소환된 '배드민턴 황제', 드디어 코트 복귀!…日 모모타 겐토, 현 세계 1위와 정면 대결→팬들 "국제대회 나오라" 열광
- 9 패패패패패패패패! 안세영에 8전8패, 그런데 상금 9억!…'100만 달러' 안세영 압도적→中 왕즈이도 대단하네
- 10 이천수 충격 발언! "남아공, 고등학교 수준"…경기 운영 혹평, 홍명보호 낙승 확신했나→"조 1위 다퉜으면"
- 1 하니니 ‘떨리는 순간’[엑's HD포토]
- 2 와이퍼 ‘수상 소감을 준비했어요’[엑's HD포토]
- 3 류하 ‘사슴 눈망울’[엑's HD포토]
- 4 프로게임단 T1·젠지, 파트너십상 수상…버즈·텍스처 참석 (SOOP 스트리머 대상) [엑's 현장]
- 5 이라333 ‘신인상 수상’[엑's HD포토]
- 6 마예준 ‘잘생긴 비주얼’[엑's HD포토]
- 7 한화생명e스포츠, 2026 시즌 앞두고 팬 감사 행사 ‘HLE FAN FEST’ 개최
- 8 비비게임, '삼국지 왕전' 수석 전략관 정형돈·임용한 소장 발탁
- 9 KeSPA·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DRX·SOOP 협력 ‘마포 e진로 버프단’ 교육부장관상 수상
- 10 그라비티, '라그나로크X' 론칭 3주년 맞아 신규 직업·이벤트 진행
화보







!['결혼→돌연 은퇴' 조윤우 누구?…빅뱅 대성 군동기·'언니는 살아있다' 재벌 3세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6/0102/thm_1767312428510868.jpg)
![논란 잠잠해지기도 전에…조세호 OTT 복귀+홍진경 사진 공개, "이게 자숙?" 시선 싸늘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6/0102/thm_1767284403278695.jpg)
![누구세요? 블핑 제니 못 알아볼 뻔…'파격 숏컷' 확 달라져→새 솔로 음악 예고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6/0102/thm_1767281420606360.jpg)
![진태현♥박시은, 결혼 10년만 2세 계획 포기 "응원 멈춰도 돼, 태은이가 유일한 친자녀"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6/0102/thm_1767285377845937.jpg)
!['키스' 숙행 불륜 논란 계속…입 연 유부남 "내 여자문제 처음 아닌데, 이혼 전제였다"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6/0102/thm_176728598434867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