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김성한의 눈] 한화의 투수 혹사, 책임은 누가 지나
기사입력 2015.09.15 06:30 / 기사수정 2015.09.15 10:04
나유리 기자

우승은 모든 팀의 목표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는 승리를 위해 달린다. 승리가 목표가 아닌 팀, 선수는 프로의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승리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한화 이글스 투수진의 '혹사' 논란은 시즌 내내 논쟁거리다. 경기를 이기기 위한 운영은 어디까지나 감독의 권한이다. 하지만 선수를 무리해서 쓰는 것은 승리를 위해 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
선수를 무리해서 쓰면 그 선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라도 다음 해에는, 그 다음 해에는?
예전 이야기를 하고 싶다. 태평양에 박정현이라는 투수가 있었다. 박정현은 김성근 감독 재임 시절이었던 90년대 초반 선발, 중간, 마무리 할 것 없이 등판했고, 혹사 여파로 5~6년을 쉬었다. 그리고 99년 쌍방울에서 124이닝을 던지며 재기의 신호탄을 쏘는듯 했으나 마지막 불꽃이었다. 신윤호 역시 김성근 감독이 LG 지휘봉을 맡았던 당시 100이닝이 훨씬 이닝을 던졌고, 김현욱, 전병두 등 여러 투수들의 얼굴이 스친다.
그 선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전병두는 이미 몇 년째 오랜 재활 중이고, 나머지 선수들도 혹사 여파로 선수 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한국시리즈 같은 특수한 경기에서는 보직 파괴가 가능하다. '단기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넌트레이스는 100경기가 훨씬 넘는 장기전이다. 선수는 기계가 아니다. 오늘 던지고, 내일 또 던지고, 그 다음 날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한 운용이 아니다. 현대야구가 달리 '현대'야구가 아니다. 혹사의 후유증은 얼마나 갈 것이며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것인가.
이미 권혁, 송창식은 시즌 100이닝을 돌파했고, 안영명과 송은범 등 한화의 투수들은 대부분 정확한 보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60년대, 70년대 일본에서는 야구를 그렇게 했다. 투수들이 마땅한 보직이 정해지지 않고 '그날 그날'에 맞춰 등판했다. 그래서 결국 일본프로야구도 투수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았나. 현재 주니치의 야마모토 마사도 "50살이 될 때까지 현역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투구수 관리"라고 말했다. 직설적으로 말해 한화의 야구는 60년대 일본의 야구와 비슷한 셈이다.
이런 운영으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선수들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다. "괜찮다"고 말하는게 최선이다. 이런 방식으로 좋은 성적이 나면, 선수들은 차차 사라지고 '좋았던 성적'만 기억에 남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의 몫이다.
고양이의 목에 누가 방울을 걸 것인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한화는 16일 경기 선발로 김민우를 예고했다. 김민우는 9월 들어 2일과 4일에 구원 등판했고 이틀 후에 선발 등판해 6⅓이닝을 던졌다. 사흘 후 구원 등판한 후 그 다음날 또 선발 등판했다. 그리고 15일 선발 등판까지 김민우는 3일을 쉬었다.
엑스포츠뉴스 해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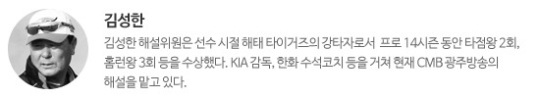
◆지난 칼럼 보기
갈 곳 없는 선수들, 독립구단으로 길 터주자
이용규의 흥분, 그리고 리그의 성숙
왜 괴물 신인투수를 보기 어려울까
한화 마운드-KIA 타선, 결국 변수가 5위 싸움 가른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 ▶ 치어리더 김도아, CG급 볼륨 몸매 대방출…'맥심 완판녀' 코앞
- ▶ 조연주, 숨길 수 없는 글래머 라인…치어복 핏에 팬들 '혼절'
- ▶ 미스맥심 우승자, 파격 언더붑 비키니…침대 위 도발적 자태
- ▶ '한국 쇼트트랙 최고 미녀', 훌러덩 벗고…여신의 반전 몸매에 '팬들 난리'
- ▶ 이민우 "김서형과 10월 6일 결혼한다고"…직접 열애설 고백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미스맥심 우승자, 파격 언더붑 비키니…침대 위 도발적 자태
- 2 [속보] '음주 뺑소니' 이재룡, 경찰 조사 끝 굳은 얼굴 "잘못된 행동 죄송"
- 3 '대마 흡입 혐의'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NO"
- 4 이경실, 지인에 뒤통수 맞았다…"1억 넘게 빌리고 잠적" 충격 고백 (롤링썬더)
- 5 천만 '왕사남', 잘 나가도 피곤하네…표절 의혹→사칭 피해 '연일 곤욕' [엑's 이슈]
- 6 '장관급 임명' 6개월…박진영, 25년 만에 내린 결단 [엑's 이슈]
- 7 3대 가왕=홍지윤, 차지연 제치고 1억 주인공…"좋게 봐주셔서 감사" 눈물 (현역가왕3)[종합]
- 8 이효리의 조용한 선행…발달장애·희귀병 유튜버 챙겼다 '미담 추가' [엑's 이슈]
- 9 홍지윤, 3대 가왕 됐다…최종 상금 1억 "국민 여러분께 감사" (현역가왕3)
- 10 엔하이픈 팬들도 몰랐다…"며칠 전만 해도 팬싸" 희승 탈퇴에 '술렁' [엑's 이슈]
- 1 세계가 깜짝 놀랐다! 선수가 감독에게 '돌진'…WBC 대표팀, 대회 도중 내분 충격→"대놓고 달려들었어"
- 2 안세영 졌는데, '중국도 아닌' 너희들이 왜 신나?…AN 37연승 달성 불발→"처음부터 다시 시작, 59연승 경신 불가능" 인도네시아 황당하네
- 3 '한국전 투런포' 대만 타자, 부인 미친 미모도 화제…"세상 다 가졌나" 극찬 터졌다
- 4 "부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비행기 탑승 직전 "이란 안 갈래요" 눈물의 선택→이란 女 축구대표팀 망명자 7명으로 늘었다
- 5 도핑 양성 나오자 "벼락 맞아서 그래!"→北 축구 '깽판' 상상초월…이번엔 판정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들어와", 선수단 철수 지시
- 6 한국 女 축구 '대형 사고' 쳤다! 정말 잘 했다! '폭력 축구' 북한 피했네+최고의 대진…월드컵 티켓 '코 앞'→여자아시안컵 8강 상대 49위 우즈벡 확정
- 7 KBO 4년 차 외인의 '끓어오르는' 분노…"대만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잖아!" 한국인보다 더 폭발했다 [WBC]
- 8 "한국팀이 일본팀 이기는 것? 기적에 가깝다…日 구단 거의 연습경기처럼 하더라"→정경호 감독 깜짝 발언
- 9 "문보경의 전략적 삼진! 대한민국 너무 하네"…대만 중계방송 황당 해설→SNS 테러 불렀나 [WBC]
- 10 안현민 극적 희플, 18억짜리였다!…4강 진출하면 30억에 20억 더! [WBC]
- 1 박찬화,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노영진 완파…고원재도 승리 (FSL스프링) [종합]
- 2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 AI 기반 투자정보 큐레이션 '머니터링' 가입자 20만 명 돌파
- 3 '풀세트 경기가 두 번'...노영진·이원주, 접전 끝에 각각 이지환·김유민 제압 (FSL스프링) [종합]
- 4 '한화생명e스포츠-포토그레이', 2026년 신규 스폰서십 계약 체결
- 5 '너구리의 매운 맛'…농심 레드포스, 맵 스코어 2대1로 G2 제압 (마스터스 산티아고) [종합]
- 6 넥슨, ‘K-좀비’ 앞세워 글로벌 익스트랙션 시장 정조준… 신작 ‘낙원’ 12일 테스트 [엑's 이슈]
- 7 브이파이브 게임즈, 신작 '실크로드 어게인' 세계관 영상 공개…4월 국내 출시
- 8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4주년 행사 ‘DM’서 상반기 업데이트 로드맵 공개
- 9 T1, 4월 24일 '2026 홈그라운드' 개최... 인스파이어 아레나서 3일간 열려
- 10 넷마블, 게임업계 대학생 서포터즈 ‘마블챌린저’ 25기 발대식 개최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 1 '59세' 김성령, 갑작스러운 비보 전해져…"가족들 슬픔 속 빈소 지켜"
- 2 '올가미' 故 윤소정, 향년 74세 사망…"지병도 없었는데 입원 닷새만 비보" (해방일지)
- 3 심은하 맞아? 은퇴 후 포착된 근황…확 달라진 비주얼 '충격'
- 4 '사별' 정선희, 18년만 의미심장 선언…날짜도 정했다
- 5 "유산만 두 번" 백지영♥정석원, 임신 소식에 'X됐다' 외친 사연 [종합]
- 6 "몇 명이랑 잤나 세보자" '천만 감독' 장항준, 과거 19금 발언 파묘
- 7 故이지은, 子 군입대 후 자택서 숨진 채 발견…오늘(8일) 5주기
- 8 '결혼 14년차' 이효리♥이상순, 좋은 소식 전했다…"이대로 그대로 바라봐 주시길"
- 9 권상우♥손태영, 폭풍성장한 子 얼굴 공개…"배우 비주얼"
- 10 이민우 "김서형과 10월 6일 결혼한다고"…직접 열애설 고백
- 1 '한국 쇼트트랙 최고 미녀', 훌러덩 벗고…여신의 반전 몸매에 '팬들 난리'
- 2 치어리더 김도아, 유니폼 벗더니 터졌다…맥심 비하인드 대방출
- 3 치어리더 조연주, 한뼘 의상에 드러난 글래머 자태…팬들 혼절
- 4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과 없다…'김연아 비판' 무시하고 올림픽 또 등장→밀라노 金 주인공 극찬까지 "진심으로 즐기더라"
- 5 'E컵 치어리더' 김현영, 상의 번쩍 올려 볼륨감 노출…현장 '후끈'
- 6 "이정후 목에 1550만원 반클리프 목걸이"…한국 미남 주장 패션에 일본 놀랐다 [WBC]
- 7 이연진 치어리더, 신흥 골반 여신…아찔한 라인에 팬들 '환호'
- 8 '이럴 수가!' 안세영 몰카라니, 배드민턴계 놀랐다…전영 오픈 SNS, AN 경기 전 루틴 '특집 공개'→중계진 "지금 가장 빛나는 스타 등장" 극찬
- 9 70명 사살+시신 456구+실종자 1만4095명…홍명보호 이런 곳 간다고? '죽음의 도시' 찾는 태극전사, 안전 보장 받는다→멕시코 군·경 9만9000명 투입
- 10 손흥민 쓰러졌다! 아킬레스 파열→시즌 OUT→월드컵 불발 날벼락까지…초대형 오피셜 터질 뻔→MLS, 휴스턴 살인 태클러 2명 '벌금 폭탄'
- 1 엔씨소프트, '블레이드 & 소울 NEO' 시즌2 업데이트…기념 이벤트 진행
- 2 라이엇 게임즈, '발로란트' 대회 '마스터스 산티아고' 7일 PO 시작…NS·PRX 출격
- 3 웹젠 '뮤 온라인', '고포 상자 이벤트' 진행…고가치 아이템 획득 기회
- 4 엔씨소프트 '아이온2', 신규 콘텐츠 '장비 잠재력 시스템' 업데이트…편의성 개선
- 5 '완벽한 퍼시픽 데이'…PRX·NS, FUR·M8 각각 제압하며 기분 좋은 PO 출발 (마스터스 산티아고) [종합]
- 6 브이파이브 게임즈, 판타지 MMORPG '실크로드 어게인' 한국 퍼블리싱 계약 체결
- 7 그라비티, 닌텐도 스위치용 '뽀로로 대운동회' 글로벌 출시 "온 가족 즐길 수 있어"
- 8 고원재, 혈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2로 윤창근 제압…김유민 승자조 진출 (FSL스프링) [종합]
- 9 '피크민 블룸·포켓몬GO·몬스터헌터 나우'…봄맞이 야외 '게이미피케이션' 눈길
- 10 이지환, 세트스코어 3대2로 황세종 제압…이원주도 생존 (FSL스프링) [종합]
화보







!["시세차익만 수십억원"…류준열, 가족법인 '풀대출'로 빌딩 투자 '재조명'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6/0311/thm_1773181129830583.jpg)
![프리지아 "갤럭시 쓰는 男 싫어" 발언에…"무례해" 비난 여론 확산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6/0311/thm_1773161192784670.jpg)
![엔하이픈 팬들도 몰랐다…"며칠 전만 해도 팬싸" 희승 탈퇴에 '술렁'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6/0310/thm_1773146369562224.jpg)
![천만 '왕사남', 잘 나가도 피곤하네…표절 의혹→사칭 피해 '연일 곤욕'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6/0310/thm_1773143329782198.jpg)
![이효리의 조용한 선행…발달장애·희귀병 유튜버 챙겼다 '미담 추가' [엑's 이슈]](https://image.xportsnews.com/contents/images/upload/article/2026/0310/thm_1773130015509255.jpg)

